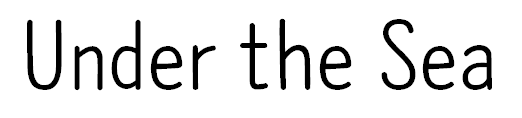https://enfj.tistory.com/m/160
1217
지난 새벽 잠에서 깼을 때 나는 지상의 별빛이 잔잔히 흐르던 그 추운 밤 속 공기에 흠뻑 젖어있었다. 잠시 전까지 꼭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금방이라도 그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오래도
enfj.tistory.com
그 난간 앞으로 나는 수없이 돌아갔다.
눈이 오지 않아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는 그 빛나던 흰 조각들과 시린 뺨을 떠올렸다. 복잡한 생각에 잠기지 않아도,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겨울 냄새를 맡으며 덤덤한 목소리를 생각했다. 난간을 붙잡고 내가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봉수대에 기대어 서서 이 순간이 멈추기를 바랐는지. 바람아 조금만 살살 불어주지, 하며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도. 그 순간에도 알지 못했던 나의 간절함을 알아챈다.
그 시간이 내게 어떤 의미로 남았길래 나를 자꾸 그곳에 묶어두게 되는건지 곱씹는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딱 하나로 나누어떨어지겠어.
'기록 >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128 (0) | 2024.01.28 |
|---|---|
| 0109 (1) | 2024.01.09 |
| 1217 (1) | 2023.12.17 |
| 2023.03.23 (0) | 2023.03.24 |
| 2022.10.13 (1) | 2022.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