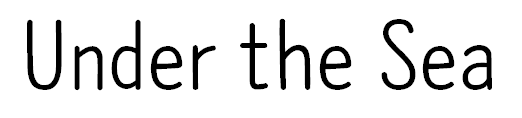경제 다큐를 보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몇 권 뒤적여봤지만 아직도 금융 개념이 너무 어렵다. 빌려주는 것(대출)과 투자가 아주 다르다는 것도 이 책을 보고 알았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신문같은데서는 설명해주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금융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준다.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이 무엇인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채권과 주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준다. 그 후 1장~3장에서는 오늘날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금융자본이 현실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기술되어있다. 정말 상세하고 친절하게 쓰여 있어서 금융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나도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고 옆에서 교수님이 기업 설계사 분과 기업가치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시는걸 듣고 아 저거 배운건데! 할 수 있게 되었다 ^-^
목차
머리말
워밍업: '금융 입문'을 위한 디딤돌 정보
1부 금융이 세계를 지배할 때
1장 외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장 달러는 어떻게 세계의 화폐가 되었나
3장 한국을 덮친 금융자본의 물결
4장 독일과 남미의 금융개방
5장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시대
2부 금융자본은 어떻게 내 호주머니를 강탈하는가
1장 주주자본주의는 애플을 어떻게 바꿨나
2장 기업의 ‘노동자 쇼핑’과 통상임금 문제
3장 조세천국으로 도망가는 기업들
4장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혀라
5장 키코 사태, 고객을 배신한 은행
6장 민영화, 금융자본의 마지막 개척지
3부 돈을 굴리는 세상, 돈이 굴리는 세상
1장 금융이 만든 오늘의 세계
2장 양적완화, 경기 회복을 위한 최후의 시도
3장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4장 앞으로 10년, 새로운 질서가 온다
5장 만약 미국이 부도가 난다면
6장 일본의 마지막 희망
7장 중국의 새로운 도전
찾아보기
'금융 입문'을 위한 디딤돌 정보
금융에 대하여
- 돈으로 돈을 사서 수익을 취하는 경제활동을 '금융'이라고 한다. 여기서 돈으로 사는 '다른 돈'은 금융상품이라고 불리며, 크든 작든, 혹은 확실하든(예금) 불확실하든(주식 등), '미래에 실현될 수익'을 '약속'하고 있다. 금융은 '현재의 돈'을 '미래의 돈(수익)'과 바꾸는 행위인 셈이다.
-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여윳돈'을 '자금 수요자(기업 등)'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데, 자금 수요자가 '괜찮은 자금 수요자'인지는 자금 수요자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정보 비대칭의 문제'라고 한다.
간접금융
- 간접금융은,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돈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여기서 금융중개기관은 '상업은행'이다.
- 자금 공급자인 가계, 기업, 정부 등은 은행에 빌려주교(예금), 이자(은행 입장에서는 수신금리)를 받는다. 은행은 이를 다시 기업, 가계 등에 빌려주고(대출) 이자(은행 입장에서는 여신금리)를 받는다.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은행은 수익(예대마진: 예금으로 모은 돈을 대출해주고 얻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위 과정을 보면 자금 공급자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 수요자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이를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상업은행
- 상업은행의 주된 업무는 예금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개인등에 대출해서 예대마진을 얻는 것이다. 예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업은행의 가장 큰 특권이고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신 면허'를 받아야 한다.
- 투자은행, 캐피털,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기관은 예금을 받을 수 없다.
- 상업은행은 은행이 도산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보험에 들어가 있다.
통화와 현금
-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어음이다. 정부의 정치적 권위를 기반으로 현금이라는 종이쪽지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현금을 가져가면 해당 가치에 걸맞은 물건을 살 수 있다고 국가가 보증한다. 그러므로 이 현금(중앙은행권)을 보유한 사람은 일종의 채권자이고, 그 돈을 발행한 중앙은행이 채무자이다.
- 그러나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찍어 사회로 내보낸 현금의 총량(화폐발행액)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화폐발행액보다 훨씬 많다. 화폐발행액은 마중물에 불과하고, 이 마중물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물을 퍼낼 것인지는 '상업은행'에 달려 있다. 상업은행이 통화를 늘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화량 늘리기와 지급준비율
- 중앙은행이 현금을 찍어내면 시중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상업은행이 보유한 증권(국채 등)을 중앙은행이 사들이거나 혹은 대출해준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의 증권을 매입하면, 중앙은행은 증권을, 상업은행은 현금을 가지게 된다.
-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민간의 A은행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국채를 매입했다고 가정하면, A은행은 현금 100만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A은행은 이 돈을 ㄱ씨에게 대출하고, ㄱ씨는 100만 원을 다시 B은행에 예금한다. 지급준비율을 10%라고 가정하면, B은행은 ㄱ씨가 예금한 100만 원 중 10만 원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남은 돈은 90만 원이고 이 돈을 다시 ㄴ씨에게 대출한다. 그리고 ㄴ씨는 C은행에 90만 원을 예금하고, C은행은 지급준비금 9만 원을 뺀 81만 원을 다시 ㄷ씨에 대출한다.
-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내보낸 100만원으로 ㄱ씨는 100만 원, ㄴ씨는 90만 원, ㄷ씨는 81만원의 예금을 가지는데 이는 모두 271만 원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불능력(통화량)이 '화폐발행액' 100만 원만큼이 아니라 271만 원만큼 증가한 것이다.
- 이 때 지급준비율이 20%로 오른다고 치자. 그러면 B은행은 100만 원 중 80만 원밖에 대출하지 못할 것이고(ㄱ씨 예금 80만 원), C은행은 80만 원 중 지급준비금(16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 바껭 대출하지 못할 것이다(ㄷ씨 예금 64만 원). 이 경우 예금 총액이 281만 원에서 244만 원으로 줄어든다. 거꾸로 지급준비율이 5%라면, 예금총액(통화량)이 280만 2500원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정부는 지급준비제도를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자기자본
- 상업은행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해당 상업은행의 주식을 발행해서 팔면 상업은행은 '밑천'을 만들 수 있다. 이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이 돈은 은행이 갚을 필요가 없는 은행 소유의 '밑천'이 된다. 이를 자기자본이라고 부른다.
부채와 자산
- 자산이란 자본금과 부채로 조달한 돈을 운용한 내역이다. 상업은행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지급준비금과 현금) 앞으로 받을 돈(대출이나 채권, 주식 투자한 돈은 일정한 시기 뒤에 회수할 것이다)을 의미한다.
- 정리하면, 상업은행은 자본금과 부채 형태로 조달한 돈(대차대조표 오른쪽)을 그냥 보유하고나 운용한다(대출이나 투자, 대차대조표 왼쪽). 즉 돈의 규모로 보면 '자본금+부채=자산'이 된다.
-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부채는 정해진 만큼의 이자를 줘야 하고 자산은 운용을 통해 이익을 얻는 부문이므로, 대차대조표 외녹에서 자산을 통해 얻는 이익이 오른쪽에서 부채 때문에 물어야 하는 이자를 웃돌아야 수익이 난다.
직접금융
- 자금 수요자가 증권(주식, 채권)을 발행해 자금 공급자에게 팔아서 자금을 '제공'받는 행위이다. 간접금융과 달리 자금 수요자가 증권을 팔아 공급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제공받는다.
- 증권을 매입한 자금 공급자는 증권을 발행한 자금 수요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이후에 금융수익을 얻어낼 권리를 가지게 되며, 또한 이 증권을 보유한 뒤에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이 증권의 가격은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한다.
채권 : 본질은 빌리고 빌려주는 것
- 채권은, 발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채무증서라고 할 수 있다. 채권 발행자는 매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이는 주식과 다른 부분이다).
- 채권의 경우 발행할 때부터 보유자에게 줘야 하는 돈의 규모(원금과 이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 : 1년동안 표면금리(채권에 적혀 있는 이자율) 20%를 기입한 액면가 1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면, 1억 원을 주고 이 채권을 사면 1년 뒤에 1억2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리 역시 20%였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액면가와 표면금리는 채권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나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은 그렇지 않다. 1년 뒤 1억2000만원을 받으려면 지금 시중은행에 얼마를 예금해야 할 것인가에 따라 채권가격이 결정된다.
-일반금리가 20%일 때 채권을 샀는데 30%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1년 뒤에 1억2000만 원을 받으려면 은행에 9200만 원을 예금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채권가격은 9200만원이 된다. 이 채권 보유자는 800만 원을 손해 본 것이다. 반대로 일반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을 거두는 것.
-즉, 일반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일반금리가 내리면 채권가격은 올라간다.
-또한 수요에 따라 채권가격과 채권 수익률도 변화된다. 채권수익률은 해당 채권을 샀을 때 얻을 수 잇는 수익을 매입가격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국채수익률: 모든 금융수익의 저변
-국가는 가장 안전한 채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채수익률은 모든 금융수익보다 낮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혹은, 특정 시점의 국채수익률에 기반해서 그보다 높게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책정된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지면, 그 나라 국채의 인기 역시 하락하면서 수요가 줄어 국채수익률이 오르고, 이에 따라 그 나라의 다른 이자율도 상승하면서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한다.
주식
-기업이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자신(기업)의 소유권 중 일부를 주식 매입자에게 넘겼다는 의미. 즉 채권이나 대출과 달리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일에 갚을 필요는 없지만, 주주는 기업의 이윤과 자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며 짧은 기간 내에 기업이 큰 경영수익을 올려 많은 배당금도 받고 주식가치도 올리도록 강제하고 싶은 입장이 된다.
공매도
-주가가 내려가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시가가 10만원인 주식이 있다 가정할 때, 어떤 금융회사가 이 주식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한 경우 주식을 '빌린다'. 예컨대 이 주식 1만 주(10억원 상당)를 한 달 뒤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빌린다. 그리고 빌린 주식을 전부 팔아 10억 원을 챙긴다. 한 달 뒤 이 주식의 가치가 5만 원으로 내려갓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엔 5억 원으로 1만 주를 산 다음 돌려주면 된다. 즉 5억 원의 수익이 남은 셈이다.
'기록 > 돈덕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독서]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2 (0) | 2022.02.02 |
|---|---|
| [독서]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1 (0) | 2022.02.01 |
| [다큐] KBS 돈의 힘 6부 (3) | 2022.01.31 |
| [다큐] KBS 돈의 힘 5부 (0) | 2022.01.31 |
| [팟캐스트] 유수진의 해요마요 0~10화(-ing) (0) | 2022.01.30 |